남은 올해는 이 시집을 읽어보아야겠다.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류정환 시인이 9년 만에 펴내는 네 번째 시집. 『상처를 만지다』 이후 발표한 작품 80편을 가려 묶었다. 거침없는 시간 속에 고단한 생애를 밀고 가는 이웃들을 경외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원숙하고 부드러워졌다. 지지고 볶는, 지겨운 삶에 낙관을 찍으며 시인은 비로소 웃는 듯하다. 소설가 연규상 씨는 “검이불루(儉而不陋),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은 글들”이라고 평했다.
저자 : 류정환
충북 보은에서 태어나 충북대 국문과에서 공부했다. 1992년 《현대시학》에 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충북작가회의 회원이다. 시집 『붉은 눈 가족』, 『검은 밥에 관한 고백』, 『상처를 만지다』와 충북 문학기행 산문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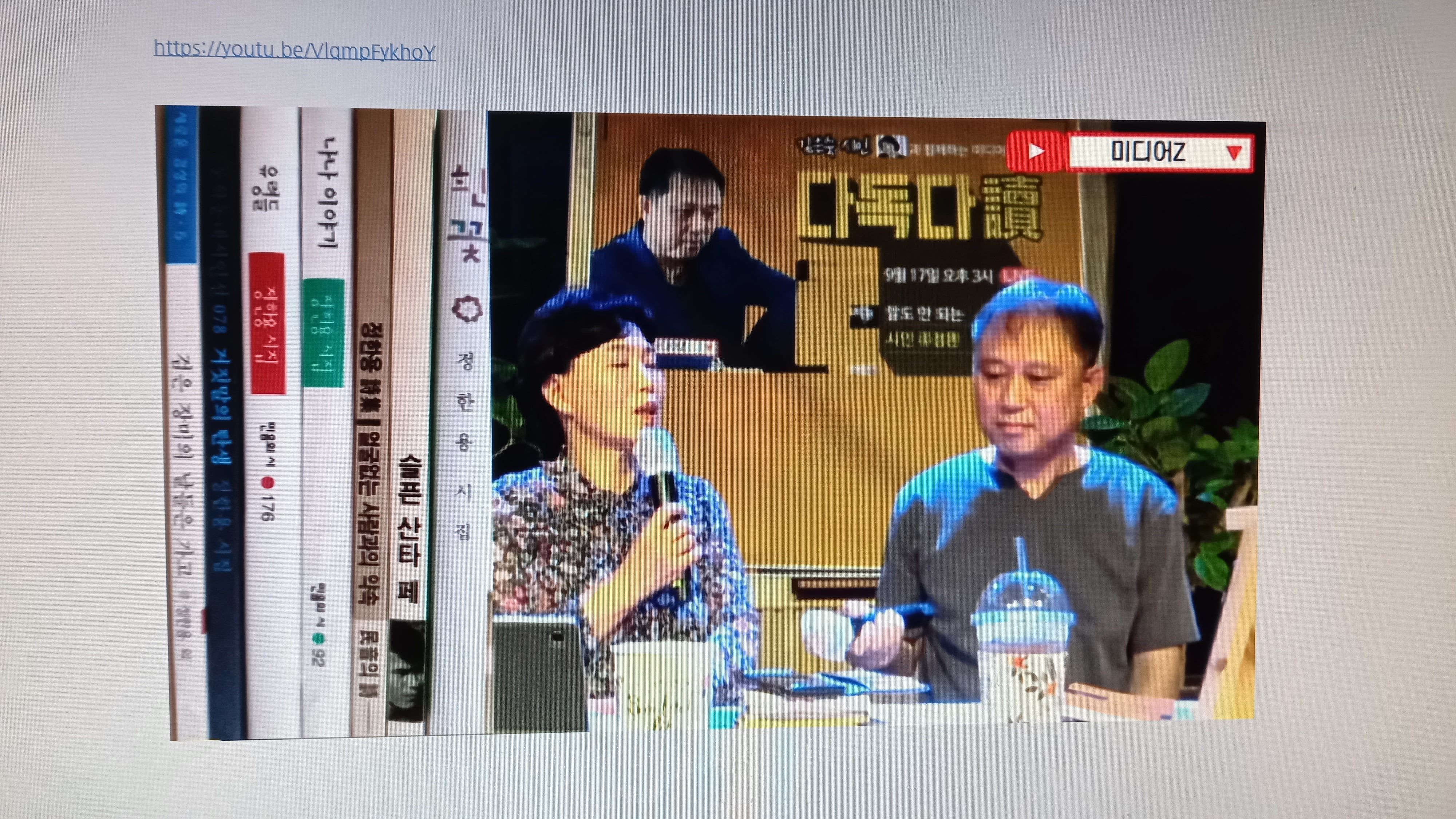
말도 안 되는
저 바다 속 어딘가에 용궁이 있을 거라고,
심청이를 꽃잎에 태워 지상으로 띄워 보내주던
용왕님이 계실 거라고 믿던 시절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세월이었다.
믿거나 말거나, 가름을 짜듯
무심한 세월이 사람 목숨을 태워서 속도를 낸다는,
아주 오래된 소문에 진저리를 치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시절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세월이었다.
그날 아침, 세월이 뒤집혀서
핏물이 가시지 않은 순대 속 같은 말들과
역한 비린내를 꾸역꾸역 쏟아낼 때
사람들은 하늘에 대고 원망을 퍼붓다가 기도를 바치다가
돌아오는 길은 어디 있나요, 울며 묻기를 거듭했으나
눈물바다에서 끝내 아무 대답도 건지지 못했다.
억장이 무너지는 세월이
낮게 가라앉아 흘러갔다.
저 하늘 어딘가에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고,
죄없는 목숨들을 데려다가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하느님이 계신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다.
말도 안되는 세월이었다
하루를 탕진하고
밤새 눈 왔다고, 딴 세상 만났다고
들떠서 뒷산에 들어 헤매었네.
큼직해보이던 발자구, 제법 그럴듯해 보이던 풍경
다 내 것인 양 한껏 뿌듯했는데
하산 길에 감쪽같이 간 곳이 없었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헛일이었네.
오후 한나절 햇살에
자취도 없이 스러지는
그 덧없고 무정한 것을 좋아라고 좇다가
하루를 탕진하고 돌아가는 길
눈치 없이 낮달은 일찍 나와
따라오며 끌끌 혀를 차는데
노을이 한바탕 붉어서
멋쩍은 얼굴을 덮어주었네.
흘리고 다닌 것들
나이 겨우 오십중반인데
뭘 자꾸 흘린다.
반찬을 집어 먹다가도 흘리고
물을 마시다가도 흘리고
할 말은 아니지만, 더러는
오줌 누다가도 찔끔찔끔 흘린다.
그러고보니 애늙은이 짓 삼십 년
이것저것 흘리고 다닌게 전부랴!
청춘은 흩날리는 꽃잎이라 흰소리를 하며
아까운 줄 모르고 흘리고 다녔지.
풍성하던 머리카락도 알게모르게 다 흘리고
그 밝던 눈도 속없이 빼앗겨서 본데없이 눈앞은 어둡고
귓속에는 사철 매미가 들어앉아 산지 오래,
여기저기 술값을 흘리고 다니느라 알랑한 주머니 그나마
도 비고
아무졌던 꿈은 다 어디다 흘려버렸는지 가슴도 헐렁하고
아, 부질없이 흘리고 다닌 말이며 글들은 또 어쩔 것인가!
가뭇없이 흘리고 다닌 것들
저기 어디쯤 저무는 길가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울고 서 있을 텐데
속절없구나, 빈 허물같이 낡은 사내여
이제 그것들을 위해 펑펑 흘릴 만한 것이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뿐이니!
'學而時習 > 문학동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기를 바라는 Lunar Pulse 입니다" (0) | 2020.12.31 |
|---|---|
| 마종기 '우화의 강' (0) | 2020.12.15 |
| 우리동네 심야책방 '늦가을 저녁은 詩로 물든다' (0) | 2020.11.26 |
| 시인들은 나이테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0) | 2020.11.21 |
| 복효근 시인의 '디카시'가 뭐지? (0) | 2020.11.17 |



